|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은 오마이뉴스 에디터의 사는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
지난 8월 덴마크 출장을 다녀왔다. <오마이뉴스>가 진행하는 테마여행 브랜드 '꿈틀비행기' 14호(8월 7일부터 15일까지)에 탑승해서 일반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이곳저곳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그때 우연히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독자로서 참가자들의 생각을 듣게 됐는데, 뜻밖에도 기사 분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오마이뉴스> 기사는 정말 길어요. 누가 더 길게 쓰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뜨끔했다. 실제로 일하면서 긴 기사가 많다고 느낀다. 그걸 독자가 알고 있고, 또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는 데 놀랐다. 편집국 내부에서도 긴 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때가 있었다.
일정 분량 이상이면 기사 입력 자체가 되지 않도록 기사쓰기 편집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부터, 긴 기사는 데스크가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던 걸로 기억한다. 긴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다소 허망하다. 모두 강제로 짧게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가능한 짧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다. 에디터들이 업무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한 것. 최근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문화로 분류되어 들어오는 기사 가운데, A4 용지로 4장이 넘어가는 기사들은 채택하지 않거나, 줄여서 다시 보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아마도 긴 기사를 보낸 시민기자라면 에디터들에게 한번쯤 '줄여서 다시 보내주시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여행 기사는 사진을 10장 이상씩 보내는 경우 그 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기사도 A4 용지로 3장이 넘는데 사진이 열 장 이상이면 스크롤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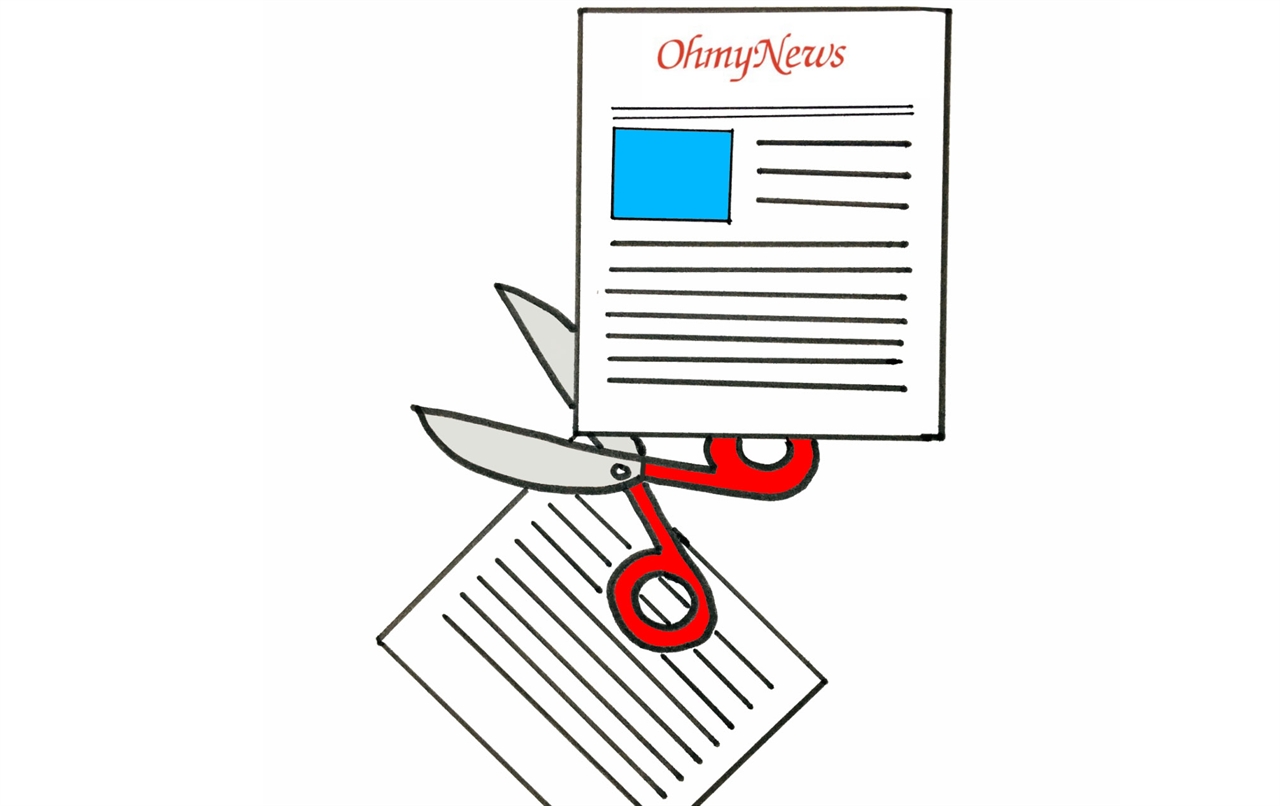
▲아마도 긴 기사를 보낸 시민기자라면 에디터들에게 한번쯤 '줄여서 다시 보내주시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 금경희
책동네의 경우도 마찬가지. 줄거리를 상당 부분 노출하거나, 내용이 너무 장황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수 없는 긴 기사들이 많다. 그럴 때는 기사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글을 통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가며 정리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끔은 "왜 분량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언론에서 분량을 신경 쓰며 기사를 써야하냐?"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왜 그럴까? 왜 기사를 짧게 써야할까? 함께 일하는 에디터에게 질문해봤다.
A 에디터 : "기사는 읽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잖아요. 독자의 마음에 와닿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려면 분량도 알맞게 조절해야죠. 인터넷 신문에도 적절한 기사 분량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B 에디터 : "글을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한 거잖아요. 당연히 읽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가장 적은 글자수로 가장 많은 기쁨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독자가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기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봐요. 읽는 일도 노동이니까요."
C 에디터 : "기사 길이가 길든 짧든 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사, 좋은 기사에는 반응한다고 봐요. A4 1장짜리를 쓰든, 3장짜리를 쓰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택하는 거고, 부족하면 채택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칼럼, 사설 같은 경우엔 사실 관계 파악 후 거기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설명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기사 분량을 짧게 쓰는 데만 맞추려다가 자칫 왜곡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기사를 짧게 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C 에디터의 말처럼 때론 긴 호흡의 기사도 필요하다. 소재와 주제가 매력적이고 문장이 간결한 긴 기사는 아무리 길어도 쉽고 빨리 읽힌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가 쓰는 연재 <이면N>은 그런 점에서 소개할 만한 기사다.
김성욱 기자는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난 이후 한 달 동안 그곳에 체류하면서 기사를 썼다. 기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사그라진 뒤에도 현장에 남아, 알려야 할 것들을 보도했다.
때마침 시사주간지에서 "포털 뉴스 제목만으로 세상사를 알아가는 시대에 OOO은 긴 기사를 찾아나섭니다. 선악이 불명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타올랐다 사라지고 마는 일들의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깊이, 사건을 천천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쓴 걸 봤는데, 김성욱 기자의 연재 <이면N>은 바로 '사건을 천천히 바라보는 눈'이 된 좋은 사례다.
정리하면, 이처럼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기사가 아니라면, 기사는 짧을수록 좋다. 긴 기사를 편집기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독자는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에디터들의 말 중에서 '읽는 일도 노동'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