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은 오마이뉴스 에디터의 사는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
참 성가시다. 가끔은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쓴다는 것은 더욱. 그런데도 왜 쓰려는 것일까? 95퍼센트의 성가심을 상쇄하고도 남을 5퍼센트의 감동(의 여운) 때문이리라. 감동을 글로 옮기는 작업은 늘 버겁다. 일단 책을 다시 읽었다. 가슴 멍했던 장면에서 다시 가슴이 멍해진다. - 안준철 시민기자
서평 쓰는 일이 얼핏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나도 쓰면서 알았다.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 내 마음에 남은 대목이 뭔지, 그 대목이 왜 내 마음 속에 남았는지를 세세하게 살피는 건 참 성가신 일이다.
그럼에도 쓰게 되는 이유는 뭘까. 안준철 시민기자의 말대로 '95퍼센트의 성가심을 상쇄하고도 남을 5퍼센트의 감동(의 여운)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책은 반드시 알려야 해' 하는 사명감 때문일 수도 있다. 뭐가 됐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서평을 쓴다.
독자인 내가 읽을 때 좋은 서평은, 나도 한번 사서 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글이다. 그런데 기사로만 봤을 때는 혹 했던 책들을 막상 내가 보면 별로인 것도 있다. 그러면 왜 이 책이 별로 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그가 느낀 감동을 나는 왜 못 느꼈는지 생각해본다.
반면 내가 느낀 감동의 지점은 어떤 부분이었고, 왜 그런지도 따져 본다. 이런 차이는 당연하다. 그와 내가 살아온 환경은 전혀 다르니까. 같은 책을 읽은 시민기자들이 전혀 다른 서평을 써서 보내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게다.
앞에 언급한 안준철 시민기자의 서평은 한번 반려한 기사였다(관련기사 :
내 인생에 들어온 강아지, 그것도 네 마리나 http://omn.kr/1jxif). 내용은 좋았지만, 분량이 너무 길었다. 서평 하나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분량은 원고지 25매 내외. A4로 치면 두 장을 조금 넘는 정도다.
분량이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지만, 편집기자는 A4 4장을 넘어가면 가급적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 줄여달라고 요청한다. 감사하게도 대부분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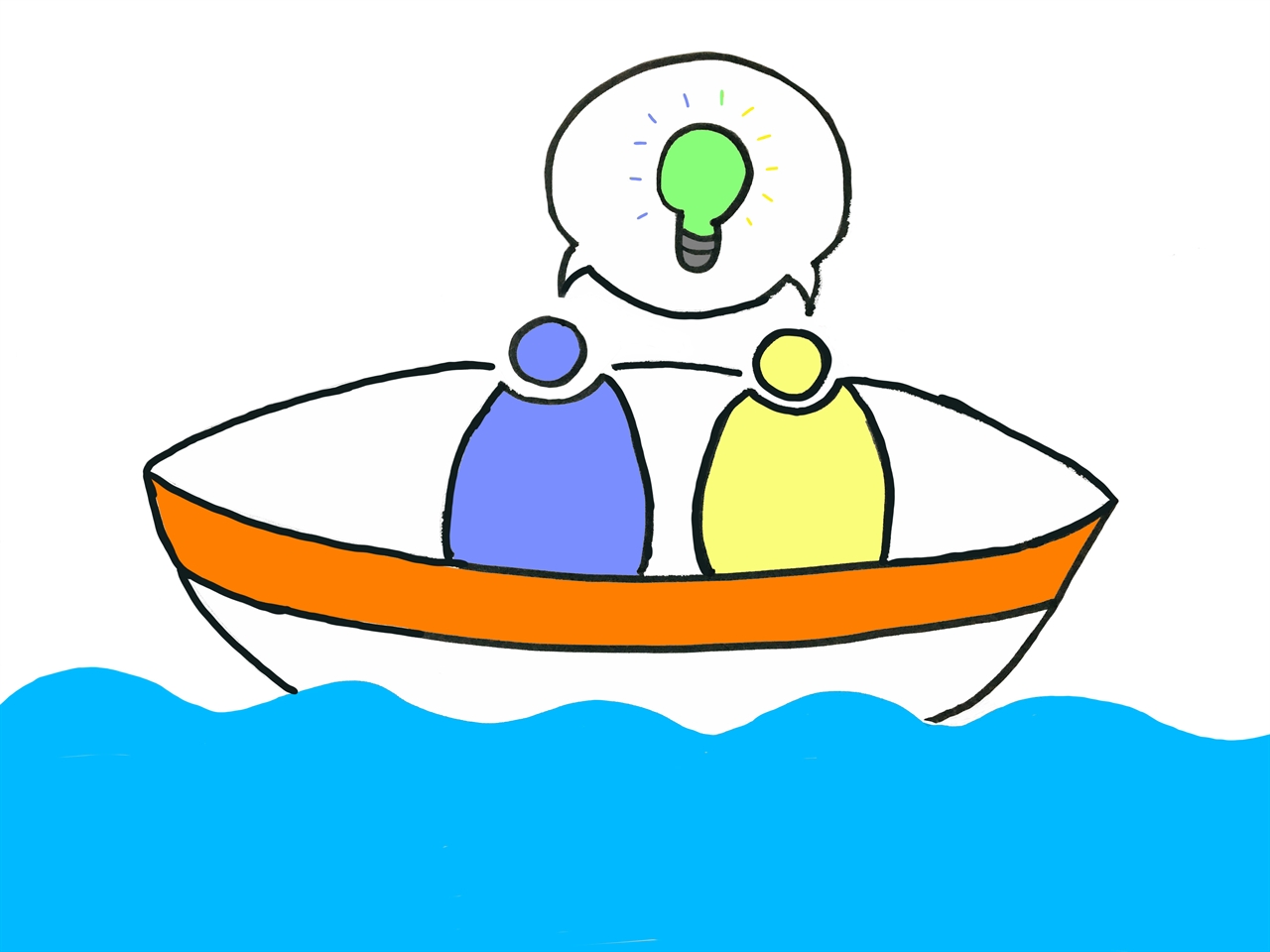
▲서로 좋은 기사를 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민기자와 내가 소통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없이 좋다.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 금경희
안준철 시민기자님은 내가 덜어내겠다고 한 부분을 살려(?)달라고 하셨다. 이유는 있었다. 그 부분이 빠지면 '성의 없는 서평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다. 내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다. 최대한 살려(?)드리고 싶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님에게 여러 번 쪽지가 왔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남으셨는지 다음날, 분량에 맞게 글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며 편집을 다시 부탁하셨다.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다. 결국 두 번 일을 하게 됐지만 괜찮았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 기사에 이 정도로 애정을 보이는 기자님으로부터 삶의 태도를 또 하나 배우는 듯했다. 기자님의 쪽지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잔뜩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제 글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편집자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너무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사는 기자의 이름을 달고 나간다. 나는 그 글을 편집하는 사람이지만, 어쨋든 그 글의 주인은 기자다. 그러니 최대한 시민기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편집하는 것도 나의 주된 일 중 하나다(아직 경험이 부족한 입사 초기에는 이 완급 조절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벌어진 흑역사만 기록해도 장편소설 감이다).
물론 간혹 그 진심을 오해 받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속상한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로 좋은 기사를 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민기자와 내가 소통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없이 좋다. 일이 많아도 힘들지 않다. 시민기자들도 내 맘 같을까.
(언젠가는 시민기자를 배려했던 내 맘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그 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또한 배움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