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암환자가 되고 나서야 제 삶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반려자의 보살핌 덕에 더 너그러워졌고, 치료 과정 중 느낀 점을 춤으로 표현하며 밝아졌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기자말] |

▲<인간극장> 출연 후기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는데, 조회수 42만 회를 기록했다. ⓒ 오마이뉴스 갈무리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 출연 후기(
<인간극장에 출연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http://omn.kr/2056m)의 조회수가 오마이뉴스 링크 기준 23만6000회를 넘었다. 네이버에서는 약 12만8000회, 다음에서는 약 5만5000회를 기록했다.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어림잡아 약 42만 명이 내 글을 읽은 것 같다(8월 19일 기준).
글을 읽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 혹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42만 명의 손가락이 상상된다. 그러자 42만 개의 손가락이 마지막에 만났을 마지막 문장, "... 각각의 분량이나 중요도는 다르지만, 모든 존재는 각각의 <인간극장> 주인공이자 조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삶을 구성함으로써 존재한다"가 새롭게 다가왔다.
내 삶이 오로지 나의 선택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시절, 다른 이의 삶에 나는 어떤 조연이자 어떤 구성 요소로 존재했을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쁜 씨앗을 전파한 일은 없었을까. 썩은 씨앗인 줄 모르고 선물이라고 내밀었던 적은 없었을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에 갇혀버려서 그를 불통의 아이콘, 암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부지불식간 전파하진 않았을까.
암을 확인한 후 퇴사했던, 바로 직전 직장에선 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적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다고 쳐도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글과 영상을 생산하는 일은 다르다.
내 손과 입을 떠나, 내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아니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이야기들이, 다른 이의 삶에 어떤 조각이나 먼지로 가 앉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구성함으로써 존재한다면, 우리의 말과 글은 어떨까.
조회수 약 42만이란 숫자 앞에서 감동과 성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다. 10여 년 전 생산했던 글과 영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인지 몰랐다

▲나는 글과 영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곳에서 일했다. ⓒ pixabay
유튜브가 대중적이지 않던 시절, 포털이 메인 화면에서 뉴스 편집권 전부를 갖고 있던 시절, 나는 글과 영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곳에 입사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의 언행을 모으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특히 비판적인 글과 영상의 전달자가 되어 버렸다.
비판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비판의 이유를 잊은 채 비판하는 건 아닌지 알아차리는 일은 비판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판을 하는 건 내 오른발을 밟은 타인이 내 왼발마저 짓밟는 일을 막기 위해다.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사과받아 용서하고 털어내어 가벼워지기 위해서다. 상대와 악연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우리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내 오른발을 밟은 후 내 왼발에 걸려 넘어지면 그 등판을 짓밟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짓밟혔어도, 내가 짓밟으면 그때부턴 순서가 상관없다. 나에게 상대는, 상대에게 나는 천인공노할 악행의 당사자가 될 뿐이다. 같이 망할 뿐이다.
처음엔 누구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비판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글과 영상이 올라간 포털 메인 화면에 댓글로 화답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억난다. 그러다 우쭐해진다. 비판과 비아냥, 조롱하는 마음이 동반한다. 이제 비판을 더 잘하고 싶어진다. 상대가 바뀔 줄 모르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설정해버리며 마음은 편하다.
비판의 대상자는 영원히 영영 소통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업그레이드된다. 이제 힘들게 초심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안 변할 건데. 어차피 상대는 악마일 뿐인데.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려는 무능력한 정치꾼들인데, 이들을 지지하는 당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비판 대상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악마화 되어버리면 이제 남은 일은 공격력을 가다듬는 것일 뿐. 상대는 적이고, 우리는 아군이다. 상대에 대한 연민을 잃어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태도가 반사될 수 있음을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에 필요한 비판에 일조했다고 보람찼던 것 같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초심을 잃었던 게 아니었을까.
상대를 이 세상에서 추방해도 정당한 악마로 상정한 내 마음이, 글과 영상에 보이지 않은 꼬리표처럼 달려서 온라인에서 널리 널리 퍼진 게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고, 다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지만 정치인을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거울인 것처럼 똑같은 분노를 갖고 상대를 미워한다.
그때 공격하던 사람들은 지금 수비를 하고, 수비하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공격 중이다. 연민이 메마른 관계에 나 역시 접착제를 한 방울 정도 보탰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서로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말과 글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지금 이 우리가 놓아버린 연민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비판 대상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 암 환자로서 십분 이해한다. 정말로 내 삶을 갉아먹는 암이라면 떼어낼 수 있을 때 떼어내야 한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움과 분노 에너지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적은 곧 나였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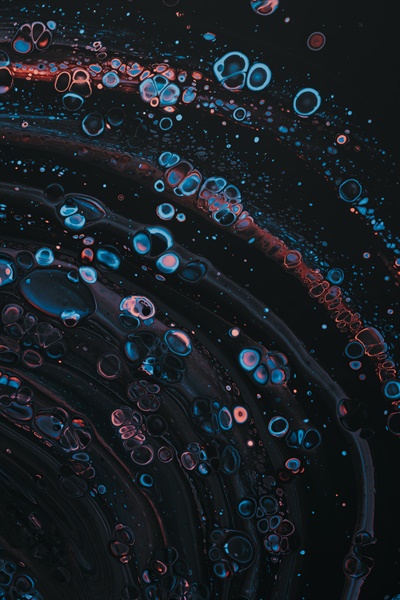
▲세포. ⓒ unsplash
암의 경우, 수술한다고 끝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대가도 있다. 수술 후 세부검사를 통해 이미 암세포가 몸 어딘가로 침윤됨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수술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처럼 항암약물주사 치료를 16회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계속 살기 위해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 암세포뿐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백혈구 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원래는 모두 내 안의 세포, 내 몸, 나였을 텐데.
<일하는 세포 black(저 하츠요 시야 잇세이)>은 세포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의인화된 몸 안 세포들의 입을 통해, 몸을 돌보지 않은 이의 상태가 세포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줄줄이 죽어나가는 백혈구를 보는 동료 세포들의 슬픔을 보며 나는 펑펑 울었다. 반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내 몸 밖에서 내 삶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이들이 있다면, 내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이지 않는다고 내 몸 안의 세계를 탐구하지 않았다.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들에게 삶의 무대를 내주도록 설계된 세포가 소멸을 거부하고 무한 증식하도록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것, 혹시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나의 반생명적 태도가 타인을 대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퍼져나가진 않았는지.
몸 안의 무수한 세포들의 합이 우리 몸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의 무수한 합이 우리 사회이고 국가이고 지구일 텐데. 우리끼리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고 그 관계를 반복하는 일에 내가 이바지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최근 '내가 잘못 썼다'고 밝힌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의 글에 눈길이 갔다. 그는 자신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글 중 "트럼프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끔찍하다(if by now you don't find donald trump appalling you're appalling)"란 구절을 자신의 쓴 최악이라고 스스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가 '확증편향의 시대에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 기획한 글 중 하나였다(
관련 해제 읽기 https://firenzedt.com/23109). 그는 트럼프를 비판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지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은 그들을 희화화했고, 나를 눈멀게 했다"라고 고백했다.
그의 마지막 문장으로 <암과 함께 춤을>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람 대신 무엇을 넣어도 다 통할 것 같다. 나의 경우 앞으로 5년은 '암'을 우선적으로 넣고자 한다. 재발의 공포에서 암을 끔찍하게 없애버릴 대상으로 싸우는 대신, 암이 생기기까지 관성으로 일관했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은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if you would win a man to your cause first convince him that you are his sincere friend)."
[곽승희의 암과 함께 춤을]
① 삭발하고... 애인과 부모님 앞에서 춤췄습니다 http://omn.kr/1yc2e
② 시장통 농협 앞에서 춤춘 날,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http://omn.kr/1yl8a
③ 항암 약물을 거부하는 몸이 알려준, 그래도 괜찮은 삶 http://omn.kr/1yu32
④ 혼자 살 땐 몰랐다, 내 짝꿍이 '요리 천재'라는 걸 http://omn.kr/1yy58
⑤ 한 발자국 내디디면 죽음... 이상하게 서글펐다 http://omn.kr/1z88c
⑥ '나는 인간도 여자도 아닌가?' 암 환자가 되고 생각했다 http://omn.kr/1ziom
⑦ 70대 같은 30대의 몸이지만... 이 얼마나 대단한가 http://omn.kr/1zq9v
⑧ 빨래 방망이 두드리고, 고함 치고... 이거 '춤' 맞습니다 http://omn.kr/1zxoy
⑨ <인간극장에 출연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http://omn.kr/2056m
*곽승희의 <암과 함께 춤을>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연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개인 브런치에도 송고합니다. 글쓴이는 춤의학교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