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가장 애용하는 니콘 fm2. md-12를 달아 사용하고 있다. ⓒ 느릿느릿 박철
오늘 아침 서울에 사는 동생이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내게 전화한 내용의 핵심은, “카메라의 가격이 얼마인가? 어느 메이커가 괜찮은 건가? 새 것으로 사야 하는가, 중고로 사도 괜찮은가?”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진을 좀 찍는다고 물어온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신이 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내 얘길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겁니다. 나의 사진 이력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아내가 처녀 적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드린 삼성에서 조립한 ‘미놀타’, 일명 똑딱이 카메라를 시집올 때 갖고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카메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듬해 강원도 정선 덕송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나는 무슨 골목대장이라도 된 것처럼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자전거를 타고 정선 읍내 DP점에 맡기고 사나흘 후에 사진을 찾으러 갑니다. 어떤 사진은 내 마음에도 꼭 드는 사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신통치 않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사진을 맡기고 찾을 때까지의 설레임은 지금 생각해보면 빛바랜 사진만큼 소중한 추억입니다.

▲니콘 90x. 단종된 모델이다. 웬만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 느릿느릿 박철
만 4년 동안의 강원도 정선에서의 생활을 접고 그 다음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장덕리에서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잘 아는 선배가 서울 황학동엘 구경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마술에라도 홀린 듯이 어떤 낯선 청년에게 cannon수동 카메라 풀 셋을 30만원 주고 샀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서울 동생에게 돈 갖고 나오라고 해서 돈을 빌려서 샀습니다. 줌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렌즈는 보급형 렌즈였습니다.
그걸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결혼식, 초등학교 졸업식, 가족 모임, 등산, 각종행사 등에 카메라를 내 분신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 무등산에 등산을 갔다가 잠시 쉴 참에 배낭을 털썩 내려놓았는데 렌즈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정이 들었던 것이라, 내 팔 한쪽이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소위 ‘뽐뿌질’(‘카메라 바디나, 렌즈를 샀다 팔았다’를 되풀이하는 것을 말함)을 모르던 시절이라 그 애석함은 필설로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양에서의 생활을 접고, 이번에는 강화 교동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동에 와서 어머니가 거처하실 작은 토담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종중 땅이라 살 수도 없고 등기 없는 토담집을 헐값에 사서 수리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한 푼 한 푼 저축한 돈이 몽땅 들어갔습니다.

▲재밌는 사진 길라잡이. 천명철. 미진사. 쉽게 쓰여져서 초보들이 읽기에 좋다. ⓒ 느릿느릿 박철
어머니가 이사 오셔서 ‘고맙다’며 큰 돈을 주셔서, ‘이 돈으로 무얼 할까?’ 하다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좀 했던 친구 목사와 함께 서울 남대문에 가서 니콘f4s를 표준 줌을 포함해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카메라 바디에 모터가 딸려 있어서 큼직한 게 우선 마음에 들었습니다. f4s는 자동 초점이 되는 바디였습니다. 반 셔터를 누르면 저절로 렌즈가 돌아가며 초점이 맞는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찾아 아무 피사체에나 렌즈를 들이대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셔터를 눌러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 입문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구입해서 읽으며 사진기를 배우는데 알아들을 만한 것도 있고 도대체 무슨 얘긴지 전혀 모르겠는 것도 있었습니다. f4s를 6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렌즈는 35-70mm 보급형 렌즈였습니다. 설명서도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의 메카니즘을 숙지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가장 선호한 구도는 피사체가 정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었고, 세로 셔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실력에 사진사 시늉을 내면서 폼을 잡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내가 사진을 잘 찍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박 목사님이 찍은 사진은 달라.”
신문에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필름을 안 넣어도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 f4s를 업자에게 헐값으로 처분하고, 보급형 기종에서는 그래도 고급에 속하는 소니f707을 역시 중고로 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중고였습니다. 사진은 잘 나오는데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셔터 소리도 그립감도 내게 맞지 않았습니다. 딱 두 달 만져보고 팔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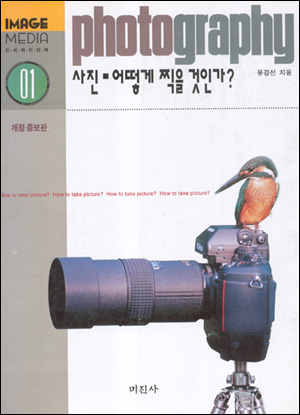
▲photography. 유경선. 미진사. 지금도 보는 책이다. 비교적 읽기 쉽다. ⓒ 느릿느릿 박철
다시 필름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f4s를 다시 구입하려 해도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니콘 801s 나중에 90x, fm2 등을 번갈아 바꾸고, 또 서울 누나가 캐논 A-1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뽐뿌질’을 배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팔았다, 샀다’를 되풀이했습니다. 우체국 문을 내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짓을 완전 그만두었습니다.
‘뽐뿌질’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에 관련한 사이트와 사진동호회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길 들락날락거리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靜)적인 사람들입니다. 느낌은 느낌으로 통합니다. 카메라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갤러리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고 사진에 대한 눈(開眼)이 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동네 지석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졸업생 앨범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동네 칠순잔치나 행사 때도 카메라를 들고 나서는데 어떤 때는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50살이 다 된 사람이 180cm키에 카메라를 들고 설쳐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예술개론. 한정식. 영화당. 제목그대로 개론이다. 좀 어렵지만 좋은 책이다. ⓒ 느릿느릿 박철
그러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불러주면 더욱 좋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가서 사진을 남겨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달려갑니다. 사진 한 장에 인생의 기쁨과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족 홈페이지 ‘느릿느릿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것도 사진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한 몫 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찍고 자연을 찍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찍고 자연을 찍습니다.” 그걸 내 나름대로 터득하는데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리움’ 이나 ‘따뜻함’이 물씬 풍겨 나오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느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고, 그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막내 동생이 나이 사십이 넘어 형을 따라 사진에 입문한다고 하니 고맙고 반가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