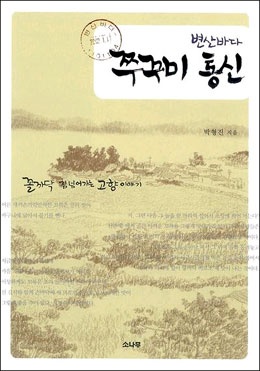
▲꼴까닥 침넘어 가는 고향 이야기 ⓒ 소나무
가마솥 뚜껑을 열었을 때, 타기 직전까지 적당히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어 목젖까지 뜨겁도록 삼키던 맛난 고구마의 뜨거운 김이 아른거린다. 시골에서 자라나 토종의 맛을 잊지 못하는 나는 지금도 무엇이든 일부러 눌어붙인다. 그리하여 자주 즐긴다. 큼지막한 뚝배기에 고구마나 감자는 물론 누룽지도 노릇노릇, 호박죽을 쑬 때도 약간 눌어 숟가락을 거머쥐고 닥닥 긁어먹는다. 이렇게 야금야금 즐기는 맛들이 푸짐한 일품요리의 맛들을 훨씬 웃도는 것은 추억까지 함께 품고 있기 때문 아닐까?
다시, 이어지는 저자의 고구마 이야기는 '어쩜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다. 밤이 차야 맛있는 초가을 고구마(밤고구마)는 불을 세게 때서 다 익었는가 싶으면 솥뚜껑을 확 열어야 한다는 것, 날이 추울 때는 물고구마가 맛있으니 물을 나수(충분히) 붓고 불을 진득하게 때며 고구마에 물 먹여 익히라는 것, 밭에서 수수 한두 모가지 꺾어다 올려서 같이 쪄먹는다는 것 등. 고구마와 같이 찐 수수 낟알 까먹으며 소일 삼는 재미는 오죽 하던가.
고구마뿐만 아니라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정도, 맛도, 글맛까지도 맛깔스럽기가 잘 영근 박을 타서 만든 흡족한 옴박지(큰 바가지) 같다 할까? 계절마다 찰랑이다가 찬바람이 나면 더욱 간절히 추억 속에서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는 따습고 맛난 것들이, 고구마 조청 졸아들며 코를 자극하던 그 단내가 책을 읽는 내내 추억 속에서 목을 감아오는 듯하였다.
<변산바다 쭈꾸미 통신>은, 막내동이로 태어난 저자가 어머니나 누님 등에 업혀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대략 1960년 중반쯤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혹독하게 이겨내야만 하던 시절이다. 저자를 통해 1958년생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봄날 두엄자리에 김이 오르듯 모락모락 피어난다.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게 모질었던 배고픔의 시절인데, 먹을 것이든 물건이든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그때가 더 간절히 그리운 것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맛도, 잃어버린 정서도 어떻게 다 추억할 수 있으랴만
쌀이 귀하여 겨우내 고구마를 밥 대신 먹다가 명절을 앞두고 조청을 고아, 실에 꿴 무를 넣어 먹던 그 맛을 어찌 잊으랴. 김장 배추를 따며 잘라 깎아 주던 배추 꼬랑지는 또 어떻고? 손님 오면 고급스럽게 내놓는다고 한쪽에 김이나 마른 반찬 거리며 귀하게 한 수저 떠서 물에 타주던 꿀을 생쥐마냥 드나들며 야금야금 얼마나 훔쳐 먹었던가. 메주 쑤는 것부터 청국장 만드는 것이나 두부 만드는 날, 김장하는 날 등의 풍경이 실감나도록 펼쳐진다. 저자는 상추쌈 한 가지를 두고서도 철철 넘쳐나는 맛깔스런 정서는 눈물나도록 정겹다.
"상추쌈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말해 둘 게 있다. 맛있게 먹으려면 쌈장도 맛있어야 하지만 상추를 많이 싸야 된다는 말이다. 열장 정도는 못 해도 일곱 여덟 장 겹쳐 싸야 상추의 제 맛이 나지 달랑 한 장 싸서 한 입에 밀어 넣고 먹어봐야 맛이 나지 않는다. 일곱 여덟 장의 상추위에 밥 한 숟가락 푹 퍼 담고, 보리새우젓 반 숟갈 넣고, 또 밥 반 숟갈 정도 퍼 얹고, 된장 조금 켜켜로 싸면 간이 고루 잘 맞아서 좋다. 이걸 양손에 들고 밥태기 뚝뚝 떨어뜨리면서 두 눈 부릅뜨고 우적우적 씹어야 제 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254쪽)
상추쌈 하나를 먹더라도 즐기는 정서나 맛이 이렇게 맛깔스러울까 싶다. 맛있는 음식뿐이랴?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의 인정 이야기들도 어찌나 풋풋하고 정겨운지 고향 동네 사람들 이야기 같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버린 고향마을이 눈에 선했다. 나뭇짐 이야기, 서리이야기, 사카린을 물에 타먹던 이야기, 생초각시니, 갈비이모니, 두 엿장수 이야기 등 큰 주제 하나에 몇 개씩 꼬리를 지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슴아슴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핏풍은 커녕 좃풍도 아니다(116페이지에서 128페이지)'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몇 번이고 펼쳐보고 싶다. '머릿니'를 둘러싼 적나라한 이야기다. 가난의 상징이요, 그 불결함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머릿니'를 이렇게 능청스럽고 천연덕스럽게 추억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양 손톱 사이에서 툭툭 터지며 죽는 이들이 생생하게 생각날 만큼, 어이없도록 능청스럽게 저자는 '머릿니'를 잡고 이야기를 듣는 독자인 나는 '머릿니' 잡는 이야기에 주책 맞게 침을 흘렸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머릿니는 물론 옷의 서캐까지 아득 바득 잡고 살아야만 했던 시절들 이야기건만 저자의 능청스러운 이야기는 해학의 극치다. 이야기꾼에도 급수가 있나보다. 옛말에 이야기 좋아하면 못 산다는데 못 사는 것은 뒷전이요, 우선 키득거리며 듣는 이야기가 옹골차게 재미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저자의 고향 옆 김제 들녘에서 자란 나에게는 아슴아슴 눈물 머금고 피어나는 내 고향 이야기들이었다.
결코 돌아 갈 수 없음에도 지난 세월로 돌아가고 싶어 함은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회상할 수 있는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되돌아갈 수 없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어 함은 흰쌀밥이 귀해서 보리죽을 먹고 살았을지라도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아 왔기 때문이리라. 우리들이 언제든 돌아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끈끈한 고향과 추억을 읽었다. 한 번씩 들춰 더 잊기 전에 내 유년을 이야기 하는 길잡이 삼아 보리라.
<변산바다 쭈꾸미 통신>은, 10년 전 저자가 이미 책으로 내었던 <호박국에 밥 말아 먹고>를 다시 정리하고 글들을 보탠 것이다. 저자의 또 다른 저서로는 <모항 막걸리집의 안주는 사람 씹는 맛이제>가 있는데 '찰지고 맛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매번 이렇게 마음에 착착 감겨든다. 추천사에서 밝힌 윤구병 선생님 말처럼 글들이 눈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변산바다 쭈꾸미 통신 -박형진 지음/ 소나무.10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