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 폭풍'에 휘말린 고3 교실의 어느 오후 쉬는 시간 풍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정은균
지윤(가명)이는 주변이 어수선하다. 흔한 말로 산만한 아이다. 지윤이에게 수업 시간은 단짝 친구와의 대화 시간이다. 지윤이는 수업 시간에 친구와 함께 거의 항상 무언가를 속닥거린다. 가끔 소심한 지윤이는 선생님 눈치를 보느라고 종이에 메모를 해가며 대화를 나눌 때도 있다.
지윤이는 짝꿍과 함께 몸으로 대화하기도 한다. 물론 대놓고 보라는 식의 커다란 몸짓은 아니다. 그래도 지윤이가 친구와 함께 몸을 언어 삼아 투닥거릴 때는 주변이 환해진다. 보지 않으려 해도 그냥 눈에 보인다.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나는 그런 지윤이가 익숙하다. 하지만 지윤이의 그런 모습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멘붕'을 불러일으킨다.
지윤이는 짝꿍이 친한 친구가 아닐 때는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가 많다. 언뜻 보면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늘 피곤해 하는 지윤이는 실제로 잠을 잘 때가 많다. 하지만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윤이가 책상 상판에 볼에 댄 채 눈을 감고 있으면 자신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고 봐야 한다. 가슴 속에 쌓인 질문이 너무나 많은 대신 그것을 들어주는 친구나 선생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여기, 유령 취급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지윤이가 엎드려 자거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에는 책상 상판에 볼펜을 '탁탁탁' 두드리며 책상과 대화한다. 그 소리는 제법 리듬감도 있다. 물론 수업이 방해될 정도의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다. 아무때나 그러는 것도 아니다. 요란스럽지 않은 수업이라면 그 소리는 상당히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누군가에는 그 볼펜 소리가 반항의 언어로 다가가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누군가가 날것의 언어로 지윤이를 욕할 때, 나 또한 날것의 언어로 그 누군가를 비난했다.
그만큼 지윤이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받는 대상이 됐다. 독재 시대 용어로 말하자면, 지윤이는 '요시찰 대상 1호'쯤 된다.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도 많다. 그때마다 지윤이 입장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감이 꽤 클 것이다. 선생님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생님들이 지윤이를 관찰하고 견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정도로만 끝낸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잠을 깨워가며 수업 들으라고 채근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사실 이 거대한 무관심의 시대에 그들의 잔소리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선생님들의 관찰과 견제와 잔소리는 아직 그들이 지윤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 나는, 선생님들이 그런 관찰과 견제와 잔소리를 적당히, 지혜롭게(!)만 한다면, 지윤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관찰도 하지 않고 견제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들은 지윤이가 친구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거나,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려 리듬 공부를 해도 모른 체한다. 그들은 지윤이와 '엮이는' 게 싫다. 지윤이 성격에 따따부따 대들지 말란 법이 없으니, 그걸 겪어내는 일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예 유령 취급을 한다. 그럴수록 지윤이의 볼펜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처량해진다.
'요시찰 대상 1호', 이런 모습도 있답니다그런데 이렇게 산만한 지윤이는 늘 에너지가 넘쳐난다. 신출귀몰하듯 위아래층 교실을 오가며 자기 벗들을 찾아다닌다. 쉬는 시간에 지윤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만난 벗들 사이에서 지윤이는 독보적으로 이야기를 주도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지윤이는 리더십이 아주 강하다.
지윤이는 또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세다. 지윤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또렷이 구분할 줄 안다. 지윤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말없이 묵묵히 잘해낸다. 자기가 보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들 좋아하는 공부는 못해도 자기 나름의 확실한 깜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윤이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자기 주도성'이 아주 강하다.
지윤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줄도 안다. 대다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한 시대라고 하지만, 교사에게 자신의 호불호를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 여전히 '갑'인 교사에게 대놓고 '찍힐' 것을 감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윤이는 그렇게 한다. 그런 점에서 지윤이는 용기 있는 아이다.
지윤이는 학교 교과 성적이 형편 없다. 수업 시간을 그리 산만하게 보내니 당연한 노릇. 그렇다고 녀석이 성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엔가 녀석이 교무실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 지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윤이는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나는 지윤이에게 수업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지윤이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갔다. 동료 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화들짝 놀란다. "(걔가) 정말이요?"라는 반문과 함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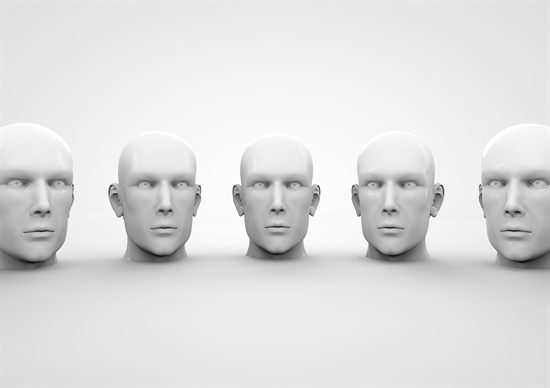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교사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가짜 나'를 만드는 것이다. ⓒ sxc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은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들을 좋아한다. 다른 이가 보기에 편애한다 싶게 그런 아이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선생님들도 많다. '평범한' 대다수 아이들 앞에서 '탁월한' 다른 아이를 치켜세우는 것이다. 모멸감도 이런 모멸감이 없다. 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옆 학교 선생님들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만 하다. 비교를 이용한 말하기는 때론 당사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교사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가짜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 '가짜 나'를 내세워 선생님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짜 나'가 '진짜 나'를 쫓아내고 '진짜' 행세를 한다. 마음의 주인이 뒤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삶은 대체로 '가짜'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교사도 인간이다. 그러니 고분고분한 아이는 편애하는 대신, '싸가지 없이' 거들먹거리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에게 무섭게 대드는 아이들이 두려워(?) 그들을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요새 아이들 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데 있다.
하지만 교사가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죄악이다. 교사의 보람이 바로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아이들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사가 할 짓이 아니다. 차별과 편견은 모두 그 대상인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
교사의 편애를 받는 아이는 교사의 시선을 의식해 '가짜' 삶을 살아간다. 이른바 교사에게 '찍힌' 아이들은 자기 존엄감을 갖지 못한 채 열등감이나 모멸감 속에서 분노와 증오를 키워 간다. 교사가 아이들 모두를 공평무사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다.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마주친 채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 까닭이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킥킥거려도 화내지 않는 아이형숙(가명)이는 국어를 좋아하는 아이다.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 학습지를 나눠주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벌써 눈빛을 반짝거린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 고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직접 쓰게 하는 활동을 많이 시킨다. 형숙이는 그런 글쓰기 활동을 다른 국어 활동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좋아한다.
형숙이가 쓰는 글은 다른 아이들이 쓴 글과 많이 다르다. 형숙이는 거의 항상 칼로 직접 깎아 쓰는 나무 연필을 사용한다. 굵다란 흑심이 들어 있는 나무 연필은 끝을 뾰족하게 깎아도 금방 뭉툭해진다. 그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양이 금방 통통해진다. 그래서 형숙이가 쓴 글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받게 된다.
형숙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연필을 꾹꾹 눌러 쓴다. 글자들도 휘갈기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 들여 쓴다. 형숙이는 덩치가 큰 글자를 즐겨 쓴다. 형숙이가 쓴 글자들은 가로와 세로가 거의 1센티미터에 가까운 '거구'를 자랑한다. 글자 상단이 우상(右上) 방향으로 15도 정도 살짝 기울어진, 형숙이의 글자 모습은 역동적이기까지 하다. 형숙이가 쓴 글자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 친한 벗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듯하다.
그런데 형숙이는 말이 느리다. 심하지는 않지만 어눌한 느낌이 나게 말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형숙이가 무언가를 발표할 때 소리 없이 킥킥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 형숙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 더듬거린다. 그런 형숙이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속이 상한다. 그 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아이를 나무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아니 안 한다. 그게 형숙이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도 형숙이는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는다. 나는 형숙이가 아이들이 킥킥거릴 때도 얼굴이 빨개지기만 할 뿐 표정이 굳어지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형숙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스럽기 그지없다. 그럴 때 형숙이는 내게 꼭 온화한 부처님 같다는 느낌을 안겨 준다. 가끔, 부끄러운 듯이 내 손에 조용히 사탕을 쥐여주고 가는 형숙이는 정 많고 인간적인 아이다.
'가짜' 탈을 뒤집어쓴 아이들, 누가 만들었나요각 반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대한민국 교실에는 부처님 같은 '형숙'이만 있는 게 아니다. 산만하게 떠들어 여차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삐딱하게 눈총을 받는 수많은 '지윤'이가 있다.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외양이나 인지적 특성을 가졌거나, 특이해 보이는 행동을 해서 눈에 쉽게 띄는 수많은 '형숙'이가 있다. 그런 '지윤'이와 '형숙'이들 한켠에 '가짜 나'가 주인이 돼 '가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이들이 또 한 무리를 이룬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굴까. 성적과 입시에 다 걸기(올인)하는 대한민국 학교의 현장 교육, 치열한 경쟁과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강조하는 야만적인 사회 분위기, '내 자식만은'이라고 외치며 욕망을 대물림하는 부모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는 교사들의 책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다. 교사들의 대오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은 3년이면 떠나가지만 교사들은 최소 5년, 아니면 거의 평생을 한 학교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혐오와 차별' 응모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