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화 건 시민기자
지난번 글에서 루브르박물관에 정말 수유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기자정신이 살아있는 시민기자의 이야기를 썼다. 그런데 정작 기사는 팩트체크를 하고도 독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기사의 일부 내용을 보자.
closed. 화장실이 고장인가 보네. 잘 됐다. 사람 없는 이곳에서 아이 엉덩이도 닦아주고 수유도 하고 나가면 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기자는 이 일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박물관 스태프가 이분의 행동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화장실 입구에 'closed'라고 분명이 알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유를 했다는 것.
시민기자는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자리를 옮겼지만 그때의 불쾌했던 감정, 그리고 여러 지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박물관 스태프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다고 기사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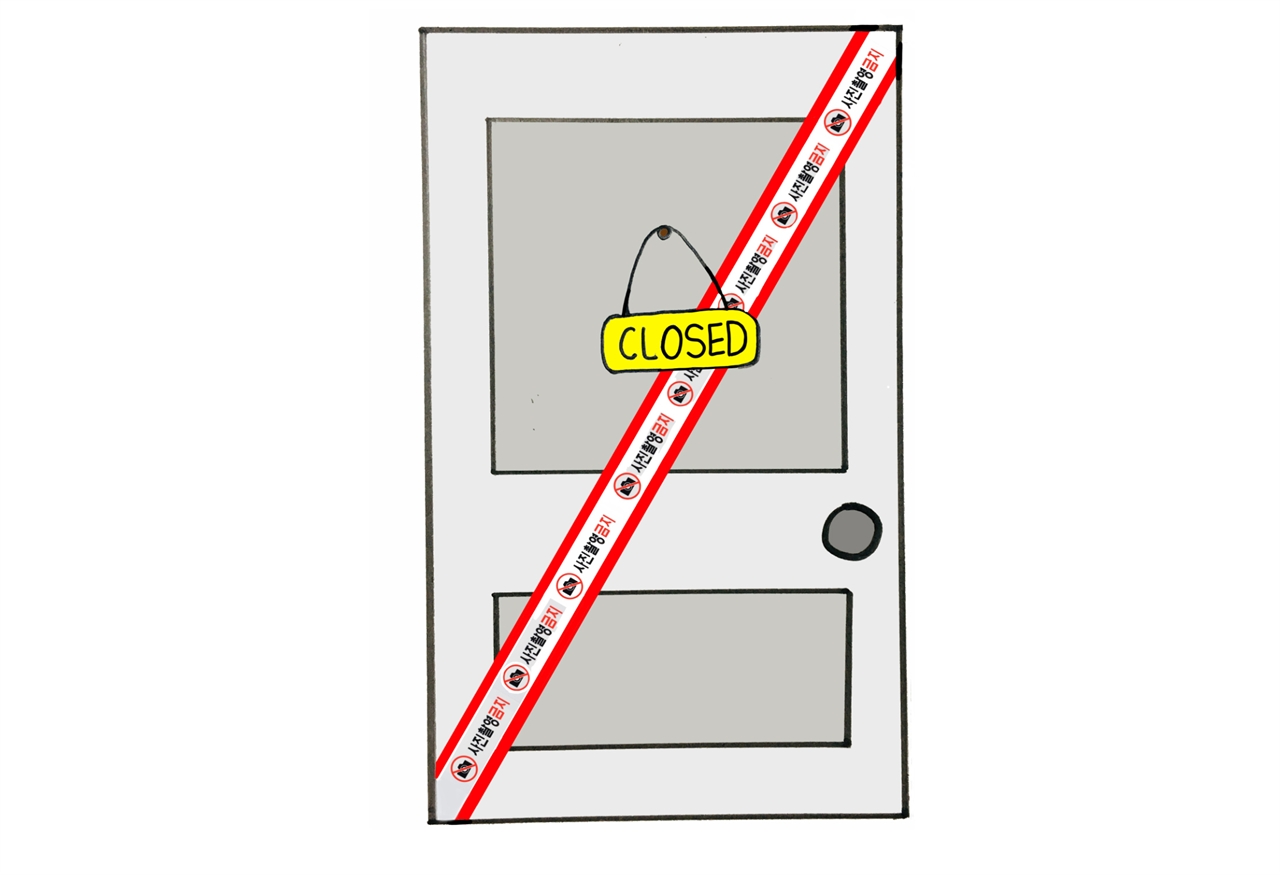
▲써도 되는 일인지! 알려도 되는 일인지! 꼭 확인하자.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 금경희
내가 처음 이 글이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건 어쨋든 그 과정에서 시민기자가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게 된 내용들을 존중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데스크 판단은 달랐다. '들어가지 말라(closed)고 경고했는데 어긴 게 문제'라는 거였다. 반박하기 어려웠다. 사실 나도 그 부분은 신경이 꽤 쓰였으니까.
데스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순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 대목이 빠지면 기사화하기엔 뭔가 약했다. 기사 수정을 앞두고 고민이 됐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시민기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다.
전화를 걸어 편집하며 고민됐던 지점에 대해 설명했다. 무리하게 기사가 나갔을 경우 달릴 수 있는 악성 댓글(악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처음 기사를 보내는 시민기자 중에 간혹 악플에 상처를 받고 다시는 기사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은 시민기자도 처음 기사를 쓰는 터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주셨다. 그리고 악플 테러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편집기자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기사를 기약해야 했다(그런데 아직 안 쓰고 계신다, 엉엉). 이것이 바로 이창희 시민기자가 무려 국제전화로 '루브르박물관에 정말 수유실이 없는지' 확인하고도 기사가 나가지 못한 사연이다(엉엉).
일이란 게 원래 한번 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해외 여행기를 쓰는 분의 기사를 검토하는데 '위험 지역이니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는데도 못 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루브르박물관의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빼고 처리하기에도 애매해 정식 기사로 채택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본문에는 '박물관은 내부 촬영 금지'라고 썼는데, 첨부된 사진은 전시관 내부를 찍은 듯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다.
"기사 본문에는 내부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써 있는데, 첨부하신 사진은 내부 사진 같아요."
"맞습니다. 금지돼 있어도 다들 찍어서... 그리고 기사에 필요한 사진이라 넣었는데요. 넣으면 안 됩니까?"
"금지돼 있으면 안 찍는 게 맞고, 설사 찍으셨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거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사 사진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은 빼고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됐다가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빼주십시오."
그랬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인 곳에 들어가 야생화를 찍어 기사로 쓰거나, '사진 찍지 말라'는 전시나 공연을 촬영해 기사로 보내는 분들이 간혹 있다. 심지어는 인터뷰한 사람이 기사화 되는 걸 몰랐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민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몰라서'였거나, '설마'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뒤늦게 편집국으로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간혹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면 정말 난감하다. 기사 삭제는 언론사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된 일. 절대 편집기자 혼자 판단할 수 없고, 여러 편집기자들의 의견을 물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한 기사 삭제는 <오마이뉴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사 채택과 동시에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기사가 전송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고, 삭제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한 업무 처리도 신속히 해야 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과정이 조금 단순해졌지만, 포털 사이트에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기사 삭제 요청해야 했을 때는 정말 '멘붕'이 오곤 했다(평일엔 그나마 다행이다, 혼자 일하는 주말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날에는...).
그러니 기사를 쓸 때는 꼭 확인하자. 써도 되는 일인지! 알려도 되는 일인지! 헷갈리면 일단 편집부에 이메일(
edit@ohmynews.com)을 보내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건 하지도, 쓰지도 말자는 거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