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봄 인사동에서의 김지하 시인.홍성식
자그마치 34년이란 긴 세월. 그럼에도 '황톳길'이란 절창을 잊을 수 없는 게 비단 기자만일까? 무소 불위의 독재자 박정희가 통치하던 암흑의 시절. 1969년 <시인>지(誌)를 통해 발표된 김지하 '황톳길'은 가슴 가득 울화와 침통을 담고 살던 청춘들의 주먹을 떨리게 만들었고,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황톳길에 선연한
핏자욱 핏자욱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삿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은 곳
부줏머리 갯가에 숭어가 뛸 때
가마니 속에서 네가 죽은 곳
밤마다 오포산에 불이 오를 때
울타리 탱자도 서슬 푸른 속니파리
뻗시디 뻗신 성장처럼 억세인
황토에 대낮 빛나던 그날
그날의 만세라도 부르랴
노래라도 부르랴…
비단 '황톳길'뿐이랴. 접신(接神)한 듯 써 내려간 담시 '오적(五賊)'과 그 자체로 뜨거운 노래가 된 '타는 목마름으로'가 던져준 감동은 어떠했으며, 그가 일신의 영달과 목숨을 담보하여 뛰어들었던 굴욕적 항일외교 반대투쟁과 반독재 반유신투쟁은 또 어떠했던가.
뻔히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옥중기 <고행 1974>를 동아일보에 실었던 두둑한 배짱의 청년 김지하. 이십대와 삼십대, 그는 '공포의 이름' 박정희에 맞서는 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대항마였다.
그를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2001년 가을이 깊어가던 명지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였다. 주룩주룩 비는 내리고 김지하의 특강은 겨우 학생 20여명을 놓고 진행되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면 북새통을 이루던 70년대의 강연회 풍경과는 거리가 먼 쓸쓸함. 세월이, 시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김지하의 얼굴도 그랬다. 거기에는 머리를 삭발한 채 오른손을 휘두르며 기자회견을 주도하던 호방함도, 불의한 권력이 장악한 법정의 오랏줄에 묶였지만 눈빛만은 불 맞은 들짐승의 그것처럼 휘번득거렸던 담대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김지하 시인.아트앤스터디
그날 김지하의 낯빛에선 그저, 힘 빠지고 우울한 예순의 노인이 읽힐 뿐이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를 마음 속 영웅으로 떠받들던 기자까지 문득 쓸쓸해졌다.
강연을 마치고 이재무와 현준만 등 몇몇의 후배작가들과 함께 한 술자리 역시 지난 시절의 뜨거움 혹은,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젊은 시절 가슴에 품었던 불길의 뜨거움 탓에 일찍 늙어버린 시인은 그 좋아하던 소주는커녕 김빠진 맥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저 불가리아 출신 프랑스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니미즘과 도시의 콘크리트 벽에서 감지되는 붕괴의 예감을 흐린 눈빛으로 소근거렸을 뿐이었다.
이후 몇 차례의 만남에서도 그랬다. 그 자리가 대산문학상 시상식이건, 책 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건,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모하는 기념식이건 김지하는 별 말이 없었다.
그저, 이미 모든 것을 일찍이 깨달은 자의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만을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다. 그 소리 없는 웃음은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불렀고, 기자는 멀리 상석(上席)에 쓸쓸히 웅크린 그가 보이면 그때마다 죽을만큼 폭음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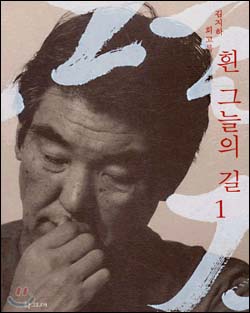
▲김지하 회고록 <흰 그늘의 길>학고재
이 짧은 글 속에서 무엇이 김지하의 육체를 쇠하게 했고, 정신을 쓸쓸하게 만들었는지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지하가 몇 마디의 섣부른 정의로 규정지어질 성질의 사람도 아닐테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청년 김지하의 목숨을 걸었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에 다름 아니었듯, 노인 김지하의 쓸쓸함 역시 비단 그만의 것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을 마치려고 하니 또 쓸쓸해진다. 최근 출간된 김지하의 회고록 <흰 그늘의 길>(학고재)을 두 번 세 번 다시 읽으면, 아무 것도 아닌 기자도 김지하처럼 '아름다움으로 전이하는 쓸쓸함'에 관해 깨달을 수 있을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