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신호가 가고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고참의 눈치를 보며 다시 전화를 했다. 역시 신호음만 울렸다. 다른 병사들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난 후, 다시 차례를 기다렸다. 마음은 저절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다시 내 차례가 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저 거기 무사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어머니는 가족은 모두 무사하다며 오히려 내 안부를 물으셨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시작된 그 전선들이 가족이 있는 곳까지 닿아있다는 걸.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전화벨 소리가 우리 집 거실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걸.
군대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등병 시절, 마치 먼 외계의 별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 막막함을. 그날 전화는 그렇게 나와 가족을 이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가 항상 따뜻한 느낌만을 전해준 것은 아니다.
조금씩 그녀의 편지가 도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도, 조금씩 그녀의 면회 횟수가 줄어들어도 나는 조금도 속상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는 곳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뿐이며, 지나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깨뜨릴 뿐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병장을 달면서 그녀는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졌다. 아마도 졸업을 앞둔 그녀의 상황과 계속 학교를 다녀야하는 내 상황이 일으키는 불협화음 때문이리라. 하지만 불협화음도 때로는 좋은 음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불안정한 멜로디를 지나 곧 조화로운 선율이 이어질 거라고 나는 애써 나를 다독였다.
하지만 말년 휴가를 정확히 1주일 앞둔 날, 그녀의 편지가 사약처럼 내게 도착했다. 투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처럼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편지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지 눈치 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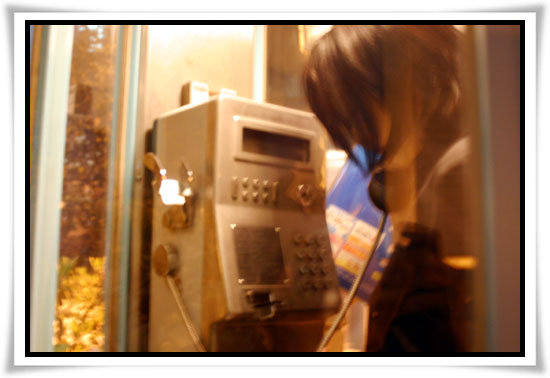
▲김태우
다음날, 아침. 휴가 신고를 하고 나와 부대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매번 휴가를 나오기가 무섭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녀와 나 사이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화를 하는 것은 둘만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지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했다. 함께 휴가를 나온 동기들이 빨리 가자고 보챘지만 나는 그들을 먼저 보내고 전화에 매달렸다. 결국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소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정말 속상한 이유는 그녀와의 헤어짐 때문만은 아니었다. 헤어지는 일도 ‘침묵의 거부’가 아니라 소통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헤어짐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건 ‘그녀의 통화 중’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때로 통화 중일 때가 있다. 간절한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아 애가 탈 때가 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도 나를 무시하는 ‘통화 중 상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소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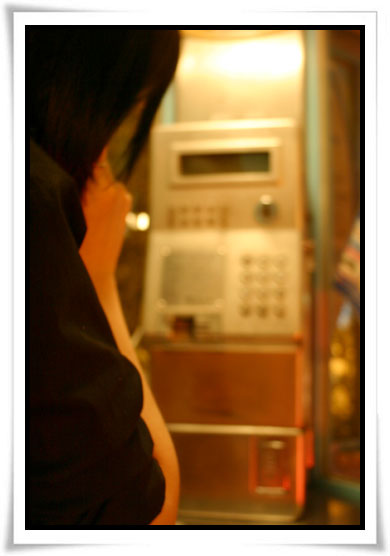
▲김태우
전화의 전선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뻗어나가 결국 그 사람에게 가 닿고, 세상에 전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믿음만이 희망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전선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내일은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선생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