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평전의 전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김종락씨.조성일
그렇지만 번역 작업은 어려웠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로 한 그 시점에 비로소 번역을 시작하는 대범함(?)으로 인해 출간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지사. 이때 그는 보다 본질적인 고민,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아예 전업농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귀농 하면 흔히 음풍농월을 떠올리거나 은퇴 후의 전원생활 같은 목가적 상상을 하기 일쑤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번역하며 내내 자신이 스코트 니어링의 삶을 흉내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농촌에서 과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차를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농사짓고, 버섯 같은 것을 채취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습디다. 요즘 농촌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스코트 니어링에서 벗어나 자꾸 김종락에게로 간다. 다시 스코트 니어링으로 돌아와 이 책의 미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책에서 스코트 니어링의 삶이 씨줄이라면 20세기 초 중반 미국사회의 변화상은 날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 학술저작을 능가할 만큼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어 읽기가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폭압하는 미국 지배층의 야만적 모습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니어링의 투쟁적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니어링의 인간적 단점에 대해서도 흥분과 주관을 극도로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어 스코트 니어링을 이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락 기자는 특히 스코트 니어링의 삶에서 무소유 철학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한다. 니어링은 상류층의 후손으로 거액의 유산 상속이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또 800달러를 주고 사두었던 독일 전시공채가 6만 달러가 넘는 가치로 평가되자 그걸 미련 없이 난로 속에 던졌다.
“자기 삶에 무척 엄격하고 철저했다는 점에서 그를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만듭니다. 구부정하고 주름 깊게 패인 깐깐한 노인 니어링이 죽을 때 정말 스스로 곡기를 끊고 아내 헬렌 니어링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정성으로 미루어 믿음이 갑니다.”
어려서 목사나 군인이 되고 싶을 만큼 출세욕이 있었지만 니어링은 어린이 노동과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다 두 차례나 대학교수직에서 쫓겨났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다며 사회주의자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기도 하다 결국 모두에게 왕따 당하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택했던 니어링. 그러나 김 기자는 니어링의 이런 삶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높아지는 삶을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주류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형편없이 쪼그려든 사람이지만 그는 처음 보다 훨씬 커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웃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아들과의 불화도 끝내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아들 존에게 있어 아버지 니어링은 숭배의 대상이자 반항의 대상이었다. 젊은 혁명가적 길을 모색하던 존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딴 용접공 자격증을 들고 전기노동조합 간부 자격으로 암스테르담을 거쳐 모스크바로 간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스탈린주의를 겪고 추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두 부자의 거리는 좁힐 수 없게 되었다.
한때 귀농붐을 일으키다!
1930년 좌파와 관계를 모두 끊으면서 니어링은 사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공적인 관계를 모두 버린다. 그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자본주의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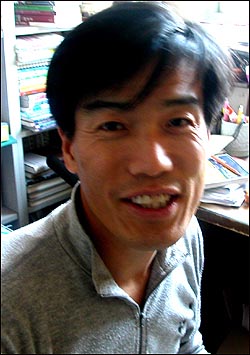
▲니어링은 주류 시각에서 보면 형편없이 쪼그라든 사람이지만 처음 보다 훨씬 커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김종락씨.조성일
이때 그는 여생을 함께 보낼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헬렌 노드(니어링)를 만나면서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자연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의 이런 실패가 혼란기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수행붐이라든지, 귀농붐이라든지,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때문에 김 기자는 그를 대단히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 책을 한창 번역할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인 거의 한 세기 전 니어링의 경고가 여전히 설득적입니다. 1923년에 쓴 <석유, 전쟁의 씨앗>이란 책을 보면 지금 이라크 전쟁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당시 참전한 미국에 대해 군국주의를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군국주의를 선택하면 민주주의는 끝장난다고 경고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계는 미국의 일국패권주의로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는 예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 기자는 <스코트 니어링의 평전>에서 보여주는 니어링의 삶에서 가장 높이 사고 싶은 그의 태도는 내내 일관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들과의 불화처럼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모순을 이 책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진정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의 휴직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곧 신문사에 복직을 해야 하는 김 기자는 휴직하면서 세웠던, <금강경> <도덕경>을 깡그리 외우는 계획을 5번 필사하는 걸로 바꾸었다며 다시 사회와의 관계망을 복원하는 게 무척 부담된다고 했다.
고립된 상태에서 자립된 삶을 영위하며 끊임없이 설교하는 니어링을 닮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가, 또다시 실용적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진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조화, 1년 살 만큼만 저축하는 무소유, 아름다운 사랑, 절제, 수행자적 삶과 마무리 등 니어링의 삶의 모든 것이 그가 여전히 닮고 싶어 하는 삶의 목표라는 사실은 고정불변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스코트 니어링 평전
존 살트마쉬 지음, 김종락 옮김,
보리, 200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