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임신 중에도 빛나는 자태'를 뽐내는 연예인들이 등장했다. 배만 뽈록 나오고 다른 신체 부위는 임신 전과 다를 바 없는 D라인은 임신부들의 '로망'이 되었다(자료사진)
unsplash
내가 처음부터 체중에 민감했던 건 아니었다. 임신 5개월, '태교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남편과 오키나와 여행을 떠났다. 멋진 바다 풍경과 함께 셀카를 찍어서 가족채팅방에 올렸는데 친정엄마에게 온 메시지.
"살찐 거가, 부은 거가." 애써 무시했지만 엄마는 그 후에도 한 번 더 딸의 모습이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확인하려고 했다. 멋쩍게 '살찐 거지ㅋㅋㅋ'라고 답을 보내자 돌아온 메시지.
"관리해야지."
나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다(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싶지만).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친정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엄마가 임신한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은 두고두고 내게 상처가 됐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엄마는 강조했다.
"너무 많이 먹지 마. 살찐 만큼 나중에 다 빼야 한다는 걸 명심해."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내 외모를 가장 먼저, 가장 신랄하게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한구석에는 벽지에 140cm, 150cm, 160cm... 눈금을 그어놓은 공간이 있었다. 엄마는 나와 동생을 세워놓고 키가 자라는 걸 매번 기록해 놓았다. 내 키가 160cm가 넘었을 때 엄마는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고 한다. 키가 작았던 엄마는 그걸 '성공'이라고 표현했다.
내 몸무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엄마였다. 대학 진학과 함께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살'에 대한 것이었다. 살이 쪄도 걱정, 살이 빠져도 걱정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비(하체비만)'였는데 엄마는 내게 늘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상의를 입혔다. 외출복을 입고 나오면 엄마는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좀 긴 티는 없나."
드라마 <미스티>에는 고혜란(김남주 분)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엄마는 김남주를 보고 정색하며 말한다.
"너 탄수화물 먹었니? 왜 이렇게 부었어?"
엄마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살아가면서, 특히 여자에게 '외모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모, 성적, 취업, 결혼... 자식의 모든 것이 곧 엄마의 성취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엄마는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야만 한다. 누구도 아빠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엄마는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거쳐야 하는 검열관 같은 존재였다. 독립해 산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거울 앞에 서면 엄마의 시선을 느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를 통해 내면화 한 사회적 시선을 느낀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볼지 끊임없이 의식한다.
탈의실에서 울던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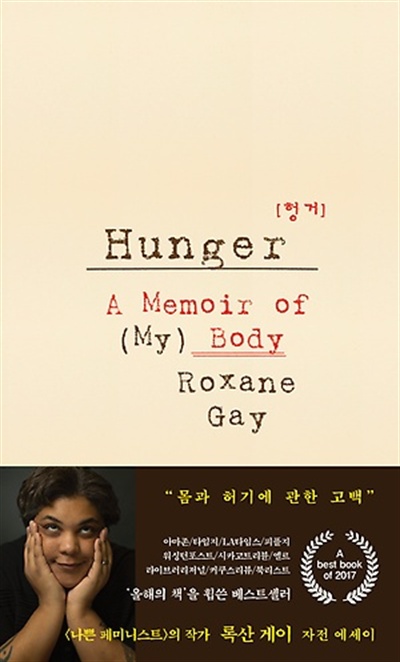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록산 게이 자전적 에세이 <헝거>
사이행성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 록산 게이는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 261킬로그램이 나갔다고 한다. 그는 에세이집 <헝거>(Hunger)를 통해 자신의 크고 뚱뚱한 몸 그리고 허기에 대해 고백한다.
"...중략...내 옷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옷 가게에 갈 때마다 엄마의 얼굴은 실망으로 어두워졌다. 나는 딸이 다른 몸을 가졌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을 보았다. 엄마의 좌절감과 수치심을 보았다...중략...그래서 나는 나 혼자 적지 않은 불만을 혹은 분노를 품었다. 엄마의 말에, 엄마의 실망에, 더 좋은 딸이 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일상인 엄마와 쇼핑하는 즐거움이 허락되지 않은 내 인생에 불만을 품었다." - <헝거> p.205
어느 날 옷을 사러 들른 매장에서 록산 게이는 탈의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한 소녀를 보게 된다. 소녀의 엄마는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매장을 나간다.
"옷 가게에서 그런 소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소녀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잘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당장이라도 그 소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p.205
엄마가 원하는 몸이 되고싶은 마음. 나도 그랬다. '평균', '정상'의 궤도를 이탈해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모범생 콤플렉스.
록산 게이는 자신이 이토록 뚱뚱해진 이유를 어린 시절 성폭행 경험에서 찾는다.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도록 자신의 몸을 거대한 요새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버렸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갈구하고 끝내 가질 수 없는 '다른 몸'을 갈구한다. 그의 인생은 허기로 가득 차있다.
역경을 이겨내고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작가가 된 록산 게이의 인생은 언뜻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디서나 눈에 띄는 큰 몸, 거듭되는 섭식장애와 다이어트 실패, 문신처럼 새겨진 자기혐오. 그는 자신의 몸에서 한순간도 도망갈 수 없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낸다.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몸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때론 낯선 사람들에게 공공 담론의 대상이 된다...중략...그들은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다. 당신은 곧 당신의 몸이고 결코 그 이상이 아니며 당신의 몸은 그보다 더 못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p.145-146
록산 게이의 글을 읽으며 내가 왜 그토록 살찌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나 잘 안다. 그건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니까. 사람을 몸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적어도 나만큼은 그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도 예외가 되길 바라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잘 알고 있다, '머리로는'

▲살이 찌건 그렇지 않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긍정하고 싶다. 그게 자존감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왜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unsplash
내 자신이 싫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살이 찌건 그렇지 않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긍정하고 싶다. 그게 자존감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왜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걸까.
록산 게이 역시 진짜 문제는 자신의 몸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머리로는. 하지만 '모든 게 내 몸 때문'이라는 익숙한 자기혐오는 번번이 그를 무너뜨린다.
"나는 멋지게 보이고 싶다. 멋진 기분을 느끼고 싶다. 지금의 내 몸으로도 아름답고 싶다.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모조리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렬한 원함, 끝없는 허기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쩌면 내가 감히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p.201
록산 게이는 말한다. 날씬함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강력한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이 거짓말은 징글징글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록산 게이의 허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여자들은 사회의 의도에 자기를 어떻게든 꿰맞추려고 한다. 여자들은 늘 배가 고프다. 나도 그렇다." p.160-161
질문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나는 엄마와 다른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의 널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 참고로 '날씬이'가 되지 못한 '날날이'는 아빠를 닮아 먹성이 좋다.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록산 게이 지음, 노지양 옮김,
사이행성, 2018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공유하기
임신중에도 'D라인' 집착, 바로 내 얘기였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