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9.5.2
연합뉴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가입의 벽은 이렇다. 법조 기자실 출입 및 기자단 가입 규칙에는 ▲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 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 이 기간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자단을 통한 자료 제공은 일절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건이 지켜졌다고 인정받으면, '최종 심판'인 기자단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지검, 대검 기자단에서 각각 투표를 하고, 재적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이 승인된다. 그런데 이런 투표 결과에 대해 대법원 1진 기자실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디어오늘>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법조출입 기자단' 2019.10.18, '기자단 밖 법조취재 기자들 부글부글' 2019.12.19.)
기자의 출입을 다른 기자들이 결정하는, 거기에 1진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가능이나 한 것일까. 참으로 후진적이고 슬프기까지 한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특권
21세기 지금 시대, 모든 조직의 운영에 개방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때, 유독 법조 기자단은 이처럼 폐쇄적·배타적·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법조 1진의 거부권 행사'에서 보이는 특권 의식과 계급주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이하고, 초현실적이다.
법조 기자단이 이렇게 운영되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출입기자들의 특권도 엄청나다. 위에서 인용한 <미디어오늘>의 기사 '기자단 밖 법조취재 기자들 부글부글'이 전하는 특권의 내용은 이렇다.
(1) 출입기자만 공식 브리핑과 보도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브리핑만이라도 듣게 해 달라는 법조를 취재하는 비출입 기자들 요청에 검찰 공보실 답은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 보도자료도 기자단에게만 제공된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배포된 보도자료는 외신 등 매체를 불문하고 요청하는 기자분들께는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왔다).
(2)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보는데도 출입기자와 비출입 기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시스템에 판결문을 올리면 공보판사가 그것을 출입기자들에게 바로 배포하는데, 비출입기자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3)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도 출입 기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특히 주요 재판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담당 재판부가 출입기자들에게만 노트북 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비출입 기자들은 휴대폰과 수첩에 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은밀한 비공식 정보통로
그런데 법조 출입기자들이 누리는 특권의 진수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흘리는 비공식정보들이다. 피의사실 내용과 수사 정보가 출입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은밀히 전달되면 '단독'의 이름으로 크게 보도된다. 유능한 검사들은 진보·보수 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분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수부 어느 차장 검사가 선별적으로 흘린 정보가 신문의 1면 머리기사 또는 방송의 톱 뉴스 등 주요기사로 다뤄지니 그를 가리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MBC가 방영한 <피디수첩> '검찰 기자단' 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곳은 검찰이 유일하다.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다." (전 검찰 출입기자 A)
"기자들이 먹고 사는 생리 구조가 검찰에 빨대를 박아 놓고 그것을 쪽쪽 빨아 먹어야 특종을 내는 구조" (전 검찰 출입 기자 B)
"검찰이 언론을 경주마처럼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건을 복사해서 준다든지 전화로 불러 준다.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불러 주는 건 사실상 공수처가 생기면 처벌 대상 1호이지 않나" ( MBC 전 검찰 출입 기자)
"우리 검찰은 보고가 반, 언론 플레이가 반이다.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흘려서 결국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 낸다. 여론전도 해야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에게 압박도 된다"(현직 검사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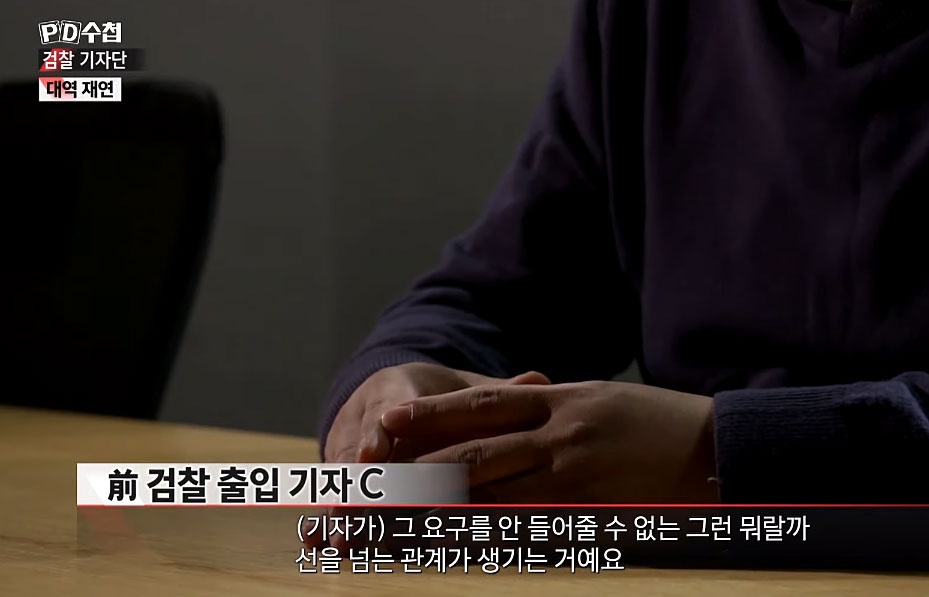
▲3일자 PD수첩의 한 장면
MBC
기자인가, 검사인가
이런 음습한 비공식 정보통로의 존재, 이를 통한 언론 플레이, 위 <피디수첩>에 나오는 기자와 검사의 발언, 그리고 그동안 쏟아져 나온 검찰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1) 정보를 흘리는 검찰은 '슈퍼 갑'이고, 그것을 받아 적은 기자는 '을'의 위치에 있다.
(2) 이런 구조에서 생산되는 기사는 거의 검찰의 주장, 시각, 논리, 프레임을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
(3) 이런 관계 속에서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검-언 공생관계이자 유착이다.
(4) 이렇듯 검찰에 '종속'된 기자는 '기자인지, 검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일화 관계에 빠지게 된다.
(5)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대로 검찰의 주장은 단지 하나의 주장이고 가설일 뿐인데, 처음 검찰 정보에 따른 보도내용은 '최종 확인된 사실' '기정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이다.
(6) 이런 확정적 보도에 따라 재판부(또는 국민배심원), 일반 국민에게 검찰 일방의 주장이 선입관으로 심어진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선입관은 보도의 피해 당사자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낙인으로 남는다.
법조 기자실 개방
법조 기자단의 기이한 구조와 제도를 보면 한국 언론의 후진성, 배타성, 특권 의식, 계급주의, 차별주의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언론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자단 관행이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한 면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 출입기자 숫자가 법조 기자단보다 훨씬 많고, 출입 매체 숫자도 훨씬 많은 청와대, 국회처럼 개방형 브리핑 룸 제도로 가면 된다. 운영과 제도를 지금 시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된다(참여정부 시절 기자실 운영을 개방형 브리핑 룸 제도로 가자고 했을 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체 언론이 들고일어나 무차별 공격을 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적을 예정이다).
그런데 기이한 출입처, 기자단의 문제가 법조 기자단에만 있는 것일까. 다른 일반 기자단, 출입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계속>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